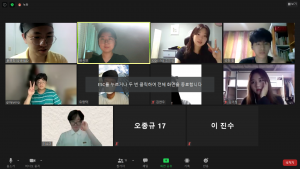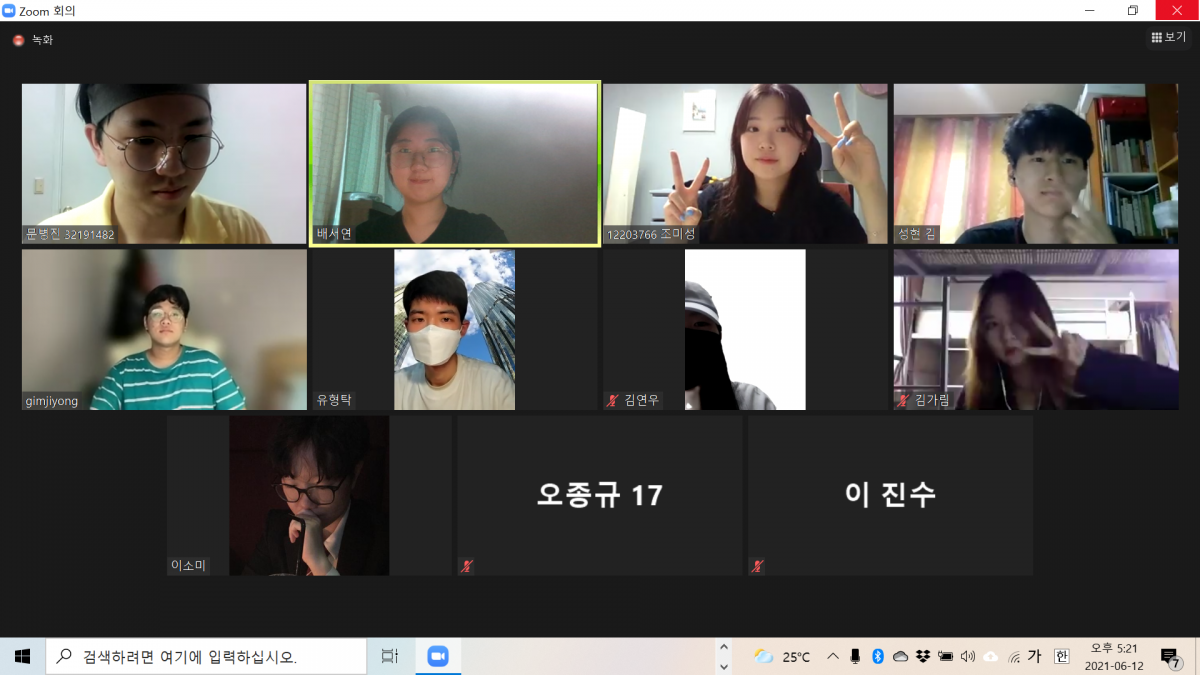
이번 멤사는 110기 문병진 씨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봄이 갔다. 요즘은 식물학 교양 시험을 준비 중인데, 꽃이란 참으로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시들 것을 알아도 꽃에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비슷해보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시험 일정을 잘못 알아서 2일동안 연속으로 네 개의 과목을 시험봤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지만, 후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최근 대학가의 관례이기에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가슴 한 켠에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남은 두 과목도 열심히 준비하고자 마음 먹었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닌 것이, 일주일이라는 유예기간동안에 나는 형이 미루어진 사형수처럼 열정보다는 여유를 선택하여 그저 책을 읽고, 동아리하고, 친구와 약속을 잡고는 하였을 뿐이다. 무기력, 권태, 나약, 그리고 오만이 근래에 들어 나의 삶을 집어삼킨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박약한 정신으로 꺼내든 책에는 나와 똑 닮은 모습을 한 인물이 두 명 있었는데, 각각 <아큐정전>의 아무개(아Q)와, <광인일기>의 ‘나’였다. 아무개는 집단에 버림받으면서 다시 그 집단에 복수를 꿈꾸는 사내로서 욕망에 솔직하지만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별볼일 없다’는 말로 요약 가능한 팔푼이였다. 말 그대로 그는 항상 땅바닥에 동전이라도 떨어져있나 확인하는 추태가 어울리며, 천문을 관측하기에는 눈이 어두워 보였다.
광인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식인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스스로를 선각자이자 계몽가로 내세우는 인물이다. 이 글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석에 따르면 식인은 유교라는 구태 악습이요, 광인은 진정 선민으로서 시대를 바로잡을 위인이다. 하지만 이는 루쉰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역사에 근거한 말이다. 이러한 속 알맹이는 쏙 빼고, 텍스트의 형식만을 갖고 온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나의 말이 금방이라도 쉽게 이해갈 것이, ‘내가 초인이요, 혁명가이니 나의 깃발 아래 오지 않는다면 모두 식인을 하는 야만이다’라는 말이 뉴스며, 유튜브이며, 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두 머저리와 어느 한 구석이 닮았는데, 자기 시대로부터 어딘가 조금 어긋났기 때문이다. 보아라. 아무개는 자기 능력에 과분하게 자원을 획득하려고 하지를 않나, 광인은 소통없이 세상이 미쳤다고 소리지르지 않는가. 나 역시 본인의 분수보다 거대한 것을 손에 쥐려했다가 깨뜨린 전적이 있으니 반도의 아무개이며, 나의 눈에 고약하면 고개를 돌리고 멸시하는 것이 고양의 미친놈이다. 하여 나는 두 인물에 대한, 한 줌의 연민과 동정을 지닐 수밖에 없었으니, 돌이켜보면 지독한 감정이었다고 말함직하다.
어저께는 유흥거리로서 리트(LEET)의 언어이해에 있던 글을 몇 개 추려서 읽었는데, 그 중 나의 최근을 설명할 실마리가 하나 있는듯 하였다. 요컨대 그 글은 멜랑콜리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몸에 검은색 즙이 많이 쌓이면, 사라진 대상을 실시간으로 현재도(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그리워하게 된다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환상을 설명하였다. 부재의 현존이라는 감정. 이 표현은 나에게, 나의 머리에 깊숙이 칼날처럼 박혔다.
아무개는 분명 어린시절에 받았던 관심과 존중, 그리고 권력감을 다시 맛보고자 원하였을 것일텐데, 이를 이루지 못하고 거짓으로 품위를 연명하려 시도했다가 거짓말처럼 숨이 끊겼다. 광인 역시 잡아먹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일상의 안전을 다시금 누리기 위한(그가 그리워한 것은 사실 정신의 나사가 빠지기 전의 고요함이 아니었을까) 발버둥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백안시이기에 좌절에 빠져, 자신 역시 식인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한다.
부재의 현존에 대한 갈망.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소설 속의 멜랑콜리커들에게 이토록 공감하는 것인가 하면, 나도 그 출처는 잘 모르겠는 것이(어쩌면 밝히기 싫을 수도 있겠다) 한동안 흠뻑 고민에 빠져 뒹굴어볼 문제이다.